홍차는 역시 고급 문화라서 그런가?
달달한 커피 맛에 익숙해진 내가 홍차를 좋아하는 외국 손님을 맞았을 때, 홍차를 사기 위해 마트를 들렸지만 헛걸음친 게 여러 번이다.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25개들이 티백 홍차가 만원을 훌쩍 넘는다. 물론 홍차 브랜드마다 가격이 상이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즐겨 먹는 일반적인 녹차나 커피보다는 비싸다.
이런 생각으로 몽골을 와보니 마트에 진열된 홍차의 종류와 가격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 종류도 다양하거니와 한국에서 파는 홍차(그것도 인터넷 쇼핑)보다 몇 배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TESS라는 차 브랜드는 심지어 한국에서는 찾아보기도 힘들다. 다만 온라인 해외직구를 통해서 2만 8천원 내외하는 희소한 제품인데 몽골에서는 3천원도 안되는 돈으로 다양한 향취를 풍기는 차를 즐길 수 있다. 더욱이 놀라운 점은 이런 차 종류만 마트의 진열장 한 면을 가득 채우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홍차 브랜드가 많았는지 놀라면서 말이다.
우스갯소리로 이 글에 ‘홍차의 나라 몽골’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몽골이 홍차를 재배하지 않지만, 몽골 국민이 소비하는 홍차 소비량이 많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해 이들이 마시는 차는 ‘수태차’인데 홍차 혹은 우롱차, 소금과 우유를 함께 섞어 끓여내는 차이다. 우려낸 차에 우유를 넣은 밀크티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몽골에서는 우유를 넣은 채로 끓여 먹기 때문이다.
몽골 자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태차 브랜드가 몇 가지 있는데 주로 중국이나 우즈벡에서 수입한 것을 쓴다고 한다.
(기마상이 있는 천진벌덕에 들리면 정성스레 우려낸 수태차를 마실 수 있다.)
조상대대로 수태차를 마시며 영양보충을 해 온 몽골인들에게는 수태차는 하나의 강력한 문화이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수태차 약간 올드한 이미지를 가진 음료이며, 그 자리를 커피가 대신 차지한다고 한다. 변화의 바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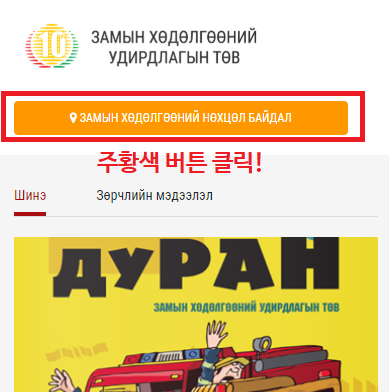
물가가 전반적으로 싸긴 한가봐요
전반적으로 저렴합니다. 식당에서 파는 음식값도 저렴하고요.